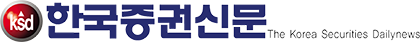정관계·법조인·학계 등 특정직업군이 독식
영·미식 제도인 사외이사제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강제 이식된 후 10년이 지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많은 부작용을 빚고있다.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젼제하는 수단으로 사외이사제가 도입됐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구제 금융을 제공한 국제기구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관 제공 조건으로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라는 강력한 요구에 따라 도입된 것이 바로 이 사외이사제. 정부는 98년부터 상장사에 한해 사외이사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모든 상장사는 이사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것이다.
경영진의 권한 남용을 감시하고, 전문성을 통해 회사 관리에 기여하리라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사외이사들은 경영진의 결정에 무비판적으로 손들어 주는 거수기, 이를 승인하는 고무도장역을 하는데 그쳤다는 비판이 우리나라는 물론 본 고장인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지배주주나 경영진과 이런 저런 인연으로 얽혀있는데다 정확한 사내 정보를 얻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해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고경영자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이다.
또 1년에 몇 번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복잡한 안건을 검토할 시간도, 전문성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사외이사들이 이름만 걸쳐 놓고, 연간 수 천만원의 보수를 받는데 만족하고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사외이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을 그야말로 치열하기 짝이 없다. 고위관료나 정치인, 경영진의 줄이 없으면 사외이사 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사외이사의 목은 최고경영자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의존도가 심하다. 그런 상황에서 최고경영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사외이사제가 성공적으로 운용되려면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이 전제 조건이다. 대주주를 견제하고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을 지적하는 역을 하기위해서는 신분의 독립성이 완전하게 보장돼야하는데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의 2조원 증자계획이 사외이사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것은 사외이사의 힘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내 권력투쟁으로 보는 시각이 정설이다. 사외이사들이 황 회장의 반대편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외이사의 직업을 보면 학계가 가장 많고 이어 재계, 관료, 법조계 출신 순이다.
263개 상장사 사외이사 798명 중 학계와 재계 출신은 각각 30.83%, 27.82%를 차지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외이사는 26%나 됐다. 그 유형을 보면 계열사 임원, 전략적 제휴 또는 거래처 인사, 총수일가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정부 또는 채권단 출신 인사 등이다.
정관계와 법조출신이 많은 이유는 경영진이 사외이사를 기업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일을 맡기려는 의도에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적 성격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관계 출신이나 시민단체 간부들의 노후 보장자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사회이사들은 상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 결과에 책임을 느끼는 강도가 매우 희박하다.
이해관계있는 사외이사를 가장 많이 선임한 그룹은 두산이다. 두산은 지난 2006년 이해관계있는 사외이사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1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선두를 유지했다.
한화와 LS는 각각 10명씩, 삼성과 금호아시아나는 9명 씩이다. 현대건설은 4명 전원이 이해관계 사외이사라는 기록을 세웠다.
사외이사의 독립성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해당 회사와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의 임직원 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는 자연인이나 법인, 거금의 출연금을 받은 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직원도 사외이사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